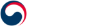치료받다 ‘개죽음’ 당해도 “병원이 모르쇠 버티면 끝”
- 작성자
- 관리자
- 추천
- 등록일
- 2022-08-22
- 내용
-
대구에 사는 류나령(40)씨는 지난달 동물병원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류씨의 5살짜리 반려견이 2년 전인 2020년 5월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 등 진료를 받다가 염증이 생겼는데, 이후 다른 병원에 입원했지만 8시간 만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류씨는 건강하던 반려견이 숨지게 된 것은 병원 과실, 즉 ‘의료사고’라고 주장한다. 처음 간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을 사용해 반려견이 감염됐고, 그다음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수의사가 퇴근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 측에서 ‘모르쇠’로 버티면 끝이니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견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면서 곳곳에 동물 의료사고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 의료 분쟁과 관련한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물 의료사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게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 분쟁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환자가 언제든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민사상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환자 측은 소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가 병원 측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도록 의료법은 환자 진료기록부에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 내용, 주된 증상, 진료 경과 등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도 쉽게 해줘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수의사는 이런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반려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해, 기록부를 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도 많다. 직장인 정진우(38)씨는 지난 2020년 5살짜리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 강아지의 각막이 손상돼 안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였다. 당시 의사는 시술과 마취 등을 거부하는 그에게 강아지 눈꺼풀 고정 시술을 권유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시술을 받은 반려견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죽었다. 정씨는 “항의를 해서 힘들게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받았지만 시술을 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했다는 내용만 한 줄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병명과 치료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김동훈 변호사는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려면 병원 진료기록부나 CCTV를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법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탓에 동물 보호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 “법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해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의사들은 진료기록부 의무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맞선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사람과 달리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 처방 없이 아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진료기록부를 통해 일반인이 마취제 같은 약물을 사서 동물에게 오남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면서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기 전에 먼저 동물 의료 체계 정비가 우선이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22/BBSQHYID6ZB73FISAHYFYFSF4I/
- 첨부파일






 댓글쓰기
댓글쓰기